회계 밖 세상
TRS 계약, 실질 지배력을 감추는 회계 트릭일까? 본문
TRS란 무엇인가요?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는 쉽게 말해, 주식의 경제적 이익은 누리면서도 형식적인 소유권은 넘길 수 있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계약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증권사에 넘기고 돈을 받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세차익이나 배당도 대주주가 챙깁니다.
즉, 지분은 팔았는데 영향력은 그대로인 셈이죠.
TRS의 기본 구조
TRS 계약의 기본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이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증권사에 매각합니다. 이때 대주주는 현금을 받게 되어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 의결권: 일반적인 매각과 달리, 대주주는 증권사에 '의결권을 저에게 넘기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즉, 주식의 소유권은 증권사로 이전되지만, 의결권은 여전히 대주주가 행사합니다.
- 경제적 효익: 주식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효익이나 손실은 대주주가 부담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그 이익은 대주주에게 돌아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 손실도 대주주가 부담합니다.
- 배당: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도 대주주가 받습니다.
- 계약 종료: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주식은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거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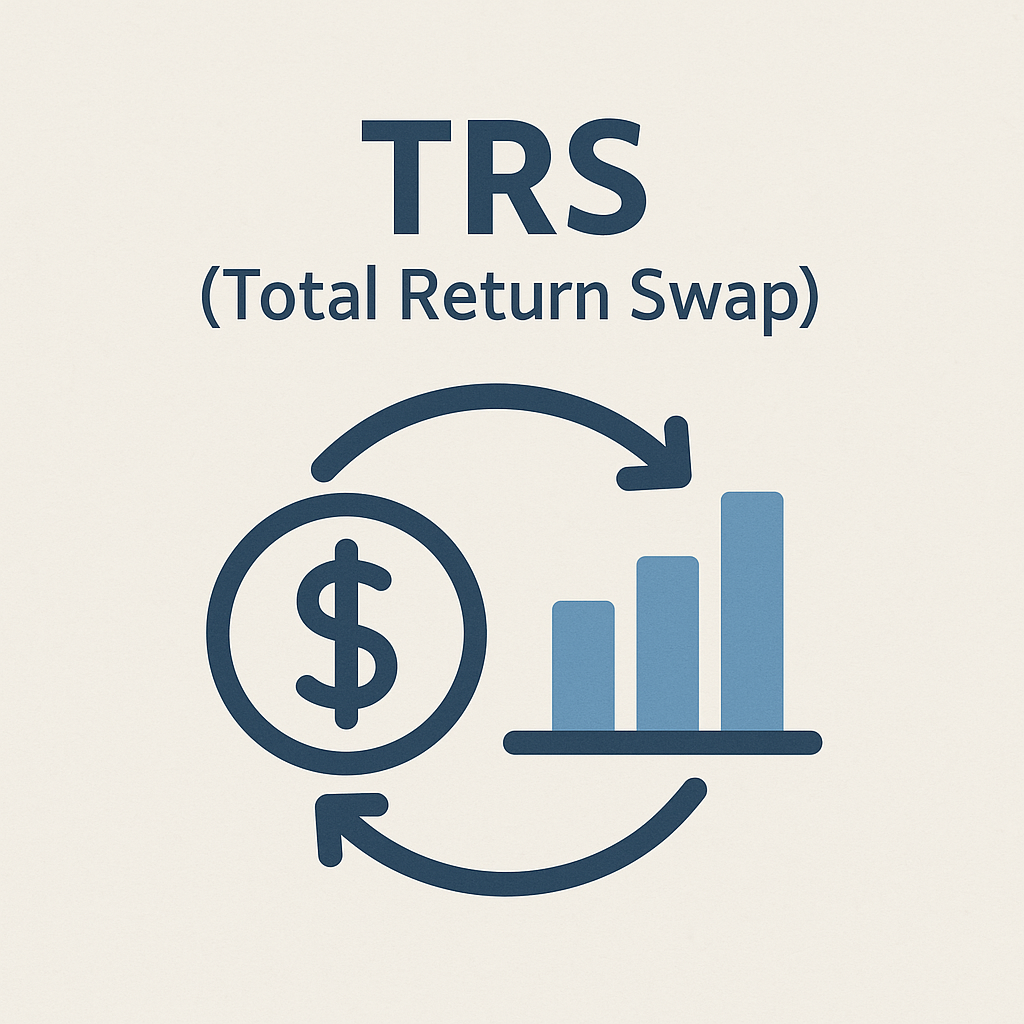
회계에서 지배력은 '지분율'보다 '실질 통제권'이 중요
회계 기준상 연결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은 지배력입니다.
- 단순히 지분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종속기업은 아닙니다.
- 반대로 지분율이 낮아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종속기업입니다.
TRS 계약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겉으로는 주식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적으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TRS와 지배력 판단의 관계
이러한 TRS 계약이 있을 경우, 회계상 지배력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는 증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과 보상, 그리고 의결권은 여전히 원 대주주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30%이고, TRS를 통해 65%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95%의 지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지배력 판단에 있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TRS 계약이 있으면 지배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적 소유권보다는 실제 위험과 보상, 의사결정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예시: 대기업 대주주의 유동화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TRS 계약으로 유동화
- 증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만 의결권은 대주주에게 넘김
- 대주주는 돈도 받고 지배력도 유지
이런 구조는 특히 자동차, IT, 금융 대기업 지배구조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며, 회계감사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실무적 중요성
이런 TRS 계약은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지배구조를 강화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TRS는 단순히 회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 계약입니다. 따라서 회계사나 재무 담당자들은 이러한 계약이 지배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서도 콜옵션 계약과 함께 TRS 유사 구조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바이오젠과의 계약 구조가 실질적으로 종속기업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었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일부 매각했지만, TRS 유사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간 지분 구조에서 TRS를 활용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배구조는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회계 기준의 시각: K-IFRS 1110 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0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즉, 법적 소유권보다 실질적인 힘(power)과 이익(returns)의 연결이 지배력 판단의 핵심입니다.
지분율보다 중요한 건 '실질 지배력'
TRS 계약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주식을 팔았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계약을 단순히 '형식'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지배력 판단은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 통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도 단순한 지분율 숫자를 넘어, 이면의 계약관계와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보자를 위한 채권 완전정복: 금리와 가격의 반비례 관계 이해하기 (0) | 2025.04.19 |
|---|---|
| 워런 버핏이 선택한 투자법: 인덱스 펀드와 ETF의 비밀목차 (0) | 2025.04.19 |
|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 완벽 해설: 대법원 판결부터 현재까지 (0) | 2025.03.27 |
|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업 성공 사례 (0) | 2025.02.22 |
| 관세와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의 갈등 (0) | 2025.02.20 |




